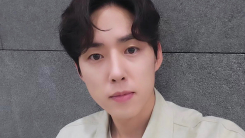[사람속으로] "산넘고 물건너"...산골 오지 희망 배달부
AD
[앵커]
매일 집집마다 편지를 전해주던 사람, 누구나 기다리는 반가운 얼굴 바로 집배원인데요.
모두가 스마트폰과 이메일로 소식을 주고받는 세상에서 집배원의 역할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보는 YTN 연속 기획 '사람 속으로', 오늘은 산골 마을 집배원의 하루를 만나고 왔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기자]
[김동훈, 양구우체국 집배원]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궁금하니까…안 가면 괜찮으신가…."
우체국에 택배 상자가 쌓이는 걸 보니 어느덧 명절입니다.
[김동훈, 양구우체국 집배원]
"이맘때 되면 많죠. 부모님들한테 과일도 보내드리고 옷도 보내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믹서기도 사서 보내드리고."
김동훈 집배원의 배달 구역은 강원도 양구군 2개 마을.
여의도 4배가 넘는 면적이지만, 사는 사람은 채 백 명이 되지 않습니다.
[김동훈, 양구우체국 집배원]
"눈이 엄청 많이 오는데 이 산을 차로 넘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아주 좋을 때 오신 거에요."
꾹꾹 눌러쓴 손편지는 손가락 터치에 밀려난 지 오래.
그래도 마을 어르신들에게 동훈 씨는 언제나 반가운 벗이고, 아들입니다.
[마을 주민]
"아무도 안 와, 집배원만 오지…. 제일 고생 많아. 제일 많이 기다리죠."
[김동훈, 양구우체국 집배원]
"문을 꼭 닫아놓고 나가신 걸 보니 안 계시나 본데…여기는 문 안 잠가요. 올 사람이 없어서."
"혼자들 사시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확인해보죠.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소리를 질러야지, 빨리 오라고."
도시로 시집간 딸에게서 온 소포.
동훈 씨 발걸음이 더 가볍습니다.
[마을 주민]
"이런 복숭아 사 먹지도 못해, 보내주니까 먹지."
[김동훈, 양구우체국 집배원]
"그전에는 여기 사람들이 다 살았었어요. 이 밑에까지 다…. 댐이 생기면서 이 길이 다 없어지고 집이 다 없어졌죠. 어떻게 보면 섬이 된 거죠, 이제."
조선 시대에는 한양과 금강산을 잇는 장터도 들어섰다는 마을.
이제는 채 열 가구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
"필요한 거 뭐 좀 부탁한다고 하면 직접 가져다주고 그런 면에서 고맙고 수고 많이 하죠."
사실 집배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동훈, 양구우체국 집배원]
"원래 제가 생활체육 테니스 강사로 있었거든요. (집배원 할) 사람이 필요한데 자격증이 꽤 많아야 해요. 이걸 하려면. 배 면허나 원동기 면허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데서 그런 사람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집배원 생활.
시급 5,820원을 받으며 하루 100km를 달리는 빠듯한 생활이지만 어쩐지 이 생활을 접을 수 없습니다.
[김동훈, 양구우체국 집배원]
"어르신들하고 점점 사이가 가까워지니까 나도 궁금해지는 거야. 그래서 여태까지 오게 된 거에요."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홍수 속에 편지와 우표, 집배원조차 생소해진 세상.
동훈 씨는 오늘도 산을 넘고 물을 건넙니다.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매일 집집마다 편지를 전해주던 사람, 누구나 기다리는 반가운 얼굴 바로 집배원인데요.
모두가 스마트폰과 이메일로 소식을 주고받는 세상에서 집배원의 역할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보는 YTN 연속 기획 '사람 속으로', 오늘은 산골 마을 집배원의 하루를 만나고 왔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기자]
[김동훈, 양구우체국 집배원]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궁금하니까…안 가면 괜찮으신가…."
우체국에 택배 상자가 쌓이는 걸 보니 어느덧 명절입니다.
[김동훈, 양구우체국 집배원]
"이맘때 되면 많죠. 부모님들한테 과일도 보내드리고 옷도 보내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믹서기도 사서 보내드리고."
김동훈 집배원의 배달 구역은 강원도 양구군 2개 마을.
여의도 4배가 넘는 면적이지만, 사는 사람은 채 백 명이 되지 않습니다.
[김동훈, 양구우체국 집배원]
"눈이 엄청 많이 오는데 이 산을 차로 넘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아주 좋을 때 오신 거에요."
꾹꾹 눌러쓴 손편지는 손가락 터치에 밀려난 지 오래.
그래도 마을 어르신들에게 동훈 씨는 언제나 반가운 벗이고, 아들입니다.
[마을 주민]
"아무도 안 와, 집배원만 오지…. 제일 고생 많아. 제일 많이 기다리죠."
[김동훈, 양구우체국 집배원]
"문을 꼭 닫아놓고 나가신 걸 보니 안 계시나 본데…여기는 문 안 잠가요. 올 사람이 없어서."
"혼자들 사시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확인해보죠.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소리를 질러야지, 빨리 오라고."
도시로 시집간 딸에게서 온 소포.
동훈 씨 발걸음이 더 가볍습니다.
[마을 주민]
"이런 복숭아 사 먹지도 못해, 보내주니까 먹지."
[김동훈, 양구우체국 집배원]
"그전에는 여기 사람들이 다 살았었어요. 이 밑에까지 다…. 댐이 생기면서 이 길이 다 없어지고 집이 다 없어졌죠. 어떻게 보면 섬이 된 거죠, 이제."
조선 시대에는 한양과 금강산을 잇는 장터도 들어섰다는 마을.
이제는 채 열 가구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
"필요한 거 뭐 좀 부탁한다고 하면 직접 가져다주고 그런 면에서 고맙고 수고 많이 하죠."
사실 집배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동훈, 양구우체국 집배원]
"원래 제가 생활체육 테니스 강사로 있었거든요. (집배원 할) 사람이 필요한데 자격증이 꽤 많아야 해요. 이걸 하려면. 배 면허나 원동기 면허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데서 그런 사람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집배원 생활.
시급 5,820원을 받으며 하루 100km를 달리는 빠듯한 생활이지만 어쩐지 이 생활을 접을 수 없습니다.
[김동훈, 양구우체국 집배원]
"어르신들하고 점점 사이가 가까워지니까 나도 궁금해지는 거야. 그래서 여태까지 오게 된 거에요."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홍수 속에 편지와 우표, 집배원조차 생소해진 세상.
동훈 씨는 오늘도 산을 넘고 물을 건넙니다.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
실시간 정보
AD
많이 본 뉴스
- 1 '미군 부상자 140명' 뒤늦게 인정..."지상군 투입 우려"
- 2 호르무즈 해협 기뢰 공포...미 해군, 유조선 호위 거부
- 3 "검·경에 대통령실까지...쿠팡, 72명 전관 방어막"
- 4 이란 여자축구 6명 호주 망명..."납치당해" 반발
- 5 아파트에서 넘어진 사다리차...놀이터 덮쳐
- 6 석유 208일분? "현실적으로 넉 달분"...물량 확보 총력
- 7 이스라엘 "시간제한 없이 파상 공격"...이란도 '눈에는 눈' 반격
- 8 호주 망명한 이란 여자축구선수들, 히잡부터 벗었다
- 9 석유 208일분? "현실적으로 넉 달분"...물량 확보 총력
- 10 김병기, 3차 소환 5시간 만에 중단..."건강상 이유"






![알뜰주유소인데 전국 인상폭 1위...결국 석유공사 사장 \'대국민 사과\' [지금이뉴스]](http://image.ytn.co.kr/general/jpg/2026/0311/202603111640299357_k.jpg)
![추방 성과 대대적 홍보하더니...선거 앞두고 달라진 백악관 [지금이뉴스]](http://image.ytn.co.kr/general/jpg/2026/0311/202603111625401781_k.jpg)
!["월드컵 다섯 경기 할 수 있습니다"...홍명보호 성과 자신한 정몽규 [지금이뉴스]](http://image.ytn.co.kr/general/jpg/2026/0311/202603111549586682_k.jpg)
!["한명회 무덤은 고속도로 가다가 봐라"...\'왕사남\' 흥행에 숟가락 얹은 천안시 [지금이뉴스]](http://image.ytn.co.kr/general/jpg/2026/0311/202603111547041996_k.jpg)
![이란 \'석유의 심장\'...트럼프 유혹하는 점령 시나리오 [지금이뉴스]](http://image.ytn.co.kr/general/jpg/2026/0311/202603111527398631_k.jpg)
!["가만두지 않겠다" 선전포고 뒤...테헤란은 \'초토화\' [지금이뉴스]](http://image.ytn.co.kr/general/jpg/2026/0311/202603111503251068_k.jpg)
!["여기 차를 보면..." 기름비 내린 이란 테헤란 현지 상황 [Y녹취록]](http://image.ytn.co.kr/general/jpg/2026/0309/202603091508533792_h.jpg)
![지상전 변수 \'쿠르드족\'...참전 시 파괴력 \'이만큼\' [Y녹취록]](http://image.ytn.co.kr/general/jpg/2026/0308/202603081125157398_h.jpg)
![트럼프가 건드린 중동의 화약고 "백악관 참모들 머리 싸맬지도..." [Y녹취록]](http://image.ytn.co.kr/general/jpg/2026/0306/202603061801438114_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