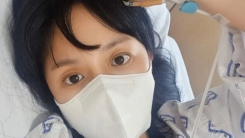병원 공개 논란...미국은 '공개'가 대세
AD
[앵커]
메르스 공포가 확산하면서 메르스 발생 지역과 의료기관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사한 상황을 경험한 미국은 초기에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한 뒤 정면돌파하는 방식을 채택해 우리 정부의 대응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LA 정재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첫 에볼라 환자가 발생하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텍사스 건강 장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환자라며 병원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환자 이름과 거주지 등도 알린 뒤 주변인들을 곧바로 격리 시켰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에볼라보다 빠르게 번지던 에볼라 공포를 차단하기 위해 전면 공개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토마스 프라이든, 미 질병통제센터 소장]
"우리는 에볼라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에볼라가 미국에 널리 퍼지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환자를 치료하다 에볼라에 감염된 간호사들과 해외에서 후송된 미국인 환자들이 국립보건원 치료센터와 에모리 대학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는 전 과정도 곧바로 발표됐습니다.
[브루스 리브너, 美 에모리대학병원 의사]
"에볼라에 걸렸던 브랜틀리 박사는 이제 완치됐습니다.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5월, 미국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미 보건 당국은 즉각 모든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환자가 머물렀던 동선과 진료받은 병원, 치료 경과 등 최신 정보를 브리핑을 통해 시시각각 알린 겁니다.
에볼라 사태 당시 일부 주가 치료 센터를 지정하면서 부작용을 우려해 비공개로 한 적이 있지만 미 보건 당국은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정보를 숨김 없이 공개하는 미국 정부의 태도는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LA에서 YTN 정재훈입니다.
메르스 공포가 확산하면서 메르스 발생 지역과 의료기관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사한 상황을 경험한 미국은 초기에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한 뒤 정면돌파하는 방식을 채택해 우리 정부의 대응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LA 정재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첫 에볼라 환자가 발생하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텍사스 건강 장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환자라며 병원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환자 이름과 거주지 등도 알린 뒤 주변인들을 곧바로 격리 시켰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에볼라보다 빠르게 번지던 에볼라 공포를 차단하기 위해 전면 공개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토마스 프라이든, 미 질병통제센터 소장]
"우리는 에볼라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에볼라가 미국에 널리 퍼지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환자를 치료하다 에볼라에 감염된 간호사들과 해외에서 후송된 미국인 환자들이 국립보건원 치료센터와 에모리 대학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는 전 과정도 곧바로 발표됐습니다.
[브루스 리브너, 美 에모리대학병원 의사]
"에볼라에 걸렸던 브랜틀리 박사는 이제 완치됐습니다.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5월, 미국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미 보건 당국은 즉각 모든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환자가 머물렀던 동선과 진료받은 병원, 치료 경과 등 최신 정보를 브리핑을 통해 시시각각 알린 겁니다.
에볼라 사태 당시 일부 주가 치료 센터를 지정하면서 부작용을 우려해 비공개로 한 적이 있지만 미 보건 당국은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정보를 숨김 없이 공개하는 미국 정부의 태도는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LA에서 YTN 정재훈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
실시간 정보
AD
많이 본 뉴스
- 1 [속보] 서울중앙지검 "김용현 변호인 3명 징계개시 신청"
- 2 [속보] 배우 안성기, 향년 74세로 별세
- 3 오늘 한중 정상회담...이 대통령 "한중, 새로운 항로 향해 가야"
- 4 "통신 보안 잘 됩니까?" 농담 주고 받았던 한중 정상...오늘 선물은? [앵커리포트]
- 5 ’한국 영화의 얼굴’ 안성기 별세..."하늘에서 연기하실 것"
- 6 트럼프의 '참수작전', 김정은에겐 불가능한 이유 [지금이뉴스]
- 7 NBA 중계화면에 놀라운 얼굴이...'엄마' 이부진, 아들과 함께 포착 [지금이뉴스]
- 8 백악관, 욕설 담긴 경고 'FAFO'...의도는? [앵커리포트]
- 9 기밀보다 빨랐던 신호...다시 움직인 ’펜타곤 피자 지수’ [앵커리포트]
- 10 충무로의 역사, 안성기...아역스타에서 국민배우까지






![9mm 두께 속에 다 들어있다...LG전자의 OLED TV 야심작 [지금이뉴스]](http://image.ytn.co.kr/general/jpg/2026/0105/202601051413403258_k.jpg)
!["유명 맛집 삼계탕서 \'황갈색\' 덩어리가"...식당 대응에도 분통 [지금이뉴스]](http://image.ytn.co.kr/general/jpg/2026/0105/202601051345146879_k.jpg)
![中서 \'마두로 체포 작전\' 영상 급속 확산..."타이완 급습할 본보기" [지금이뉴스]](http://image.ytn.co.kr/general/jpg/2026/0105/202601051336591919_k.jpg)
![항문에 금괴 314㎏ 숨겨... 8년 도주한 밀수범 최후 [지금이뉴스]](http://image.ytn.co.kr/general/jpg/2026/0105/202601051219490628_k.jpg)
![나나 역고소하더니...기가 차는 강도의 옥중편지 [지금이뉴스]](http://image.ytn.co.kr/general/jpg/2026/0105/202601051114241356_k.jpg)
![경제난보다 두려운 \'정권 붕괴\' 사자후...이란 군 통제력 잃자 \'비상계획\' [지금이뉴스]](http://image.ytn.co.kr/general/jpg/2026/0105/202601051043278517_k.jpg)
![北 정치적 성지에 우뚝 선 김주애...전문가도 처음 본 이례적 장면 [Y녹취록]](http://image.ytn.co.kr/general/jpg/2026/0102/202601021336230465_h.jpg)
!["안성기, 음식물 목에 걸렸다" 위중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중 [Y녹취록]](http://image.ytn.co.kr/general/jpg/2025/1231/202512311613051892_h.jpg)
!["이혜훈, 여러 제보 들어온다"...혹독한 인사청문회 예고 [Y녹취록]](http://image.ytn.co.kr/general/jpg/2025/1231/202512311052240680_h.jpg)